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시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렇다고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시라는 형식 자체가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 취향일 수도 있고 막연한 느낌일 확률이 크다. 우선, 책과 문학을 가까이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가 쉬울 리 없다. 그 사람에겐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문학도 쉽지 않을 것이다. 텍스트의 형태로 정보와 감정을 읽는 활동은 나름의 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어떠한 종류의 글이건 페이지 한 장 넘기기 어려운 글이 있고 술술 익히는 글이 있다. 그 차이는 글이 담겨 있는 형식이 아니라 분량, 문체, 소재, 배경 등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된다. 더 중요한 점은 그러한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난이도’를 만들어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어떠한 글이든 주관적이다. 쓴 사람에게도, 읽는 사람에게도. 시 그리고 문학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고민하기보다 객관화의 대상으로서 어떻게 읽는 것이 옳은 지를 고민하는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의 중·고등학교 문학 교실은 종교적이고 제의적이다. 이곳에서 교사는 제사장 노릇을 맡는다. 교실은 제사를 지내는 듯한 경건함과 엄숙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사 특유의 따분함이 지배하고, 웃음은 좀체 허용되질 않는다. 산 자, 곧 우리들보다, 죽은 자, 곧 시인이 우위에 서며, 교사와 학생 모두 그의 시를 경전 대하듯이 하여 구구절절이 주석을 가하고 그 정통적 주석을 받들며 암송하는 데 진력한다. 아마도 누군가가 새롭거나 주관적인 해석을 가하게 되면 그는 시험에서 이단으로 처벌될 것이다. (p.283)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시를 늘 곁에 두는 연수 덕분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연수에게 선물을 받았다. 이 책은 한양대 국어교육학과 정재찬 교수의 시 읽기 강의(“문화 혼융의 시 읽기”)를 엮어 낸 책이다.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가 이 책의 부제이다. 본 책에는 46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지만 시집이 아니다. ‘시 에세이’이다. 그래서 더 좋았고 나에게 더 필요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시집들이 나에게는 너무 ‘어렵다’고 느끼던 차였다. 저자의 깊이 있는 안내에 따라 유수한 시들을 음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책이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분명 ‘좋은 시’들을 ‘순한맛’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매력과 효용을 갖춘 책이다.
 |
|
하지만 내게 딱 필요했던 책이라고 느낀 대목은 조금 다르다. 본 책은 시는 역시 어렵다고 되뇌던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시일까? 왜 시를 읽어야 할까? 본 책을 읽고 “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하긴 쉽지 않다. 대신 저자는 “무엇이 시일까?”에 답하기라도 하듯 노래, 영화, 그림, 광고, 심지어 욕 한마디에서도 시를 읽어낸다. 사실은 애처로움이 담겨있는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 클로드 모네의 그림 <양산을 든 여인>을 떠올리고, 황동규 시인이 고3 시절 한 살 연상의 여대생에게 바친 시라는 <즐거운 편지>는 신승훈의 곡 <보이지 않는 사랑>과 비교한다. 책을 읽지 않고, 노래도 듣지 않고, 그림도, TV나 영화도 보지 않으며 욕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자는 “시와 노래가 본디 하나이던 것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모든 것들은 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든 『탈향』이든 현실은 우리에게서 노래를 박탈해 가고 그것을 ‘성장’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두 작품은 모두 한편으론 잃어버린 노래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선택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현실의 냉정함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탈향』에서 ‘하원이’에 대한 인정을 버리고 현실의 논리를 좇아 ‘하원이’를 버리게 되는 ‘나’의 선택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에서 ‘혁명’에 대한 열정을 버리고 현실에 젖어 들어 ‘월급’과 ‘물가’를 걱정하게 된 ‘우리’의 선택과 쌍둥이나 다름없다. (p.185)
또한 『시를 잊은 그대에게』가 “어떠한 시를 읽어야 할까?”에 답해줄 순 없다. 각자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저자는 시가 제공할 수 있는 감동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한다. 인류 공통의 감정, 많은 사람들이 겪을 만한 감정이 시라는 그릇에 담길 때 그만의 풍미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상기시킨다. 물론 감동은 저자의 말대로 기교나 형식이 아니라 진실에서 온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딴지를 걸 듯 이게 무슨 시냐고 묻는 질문은 부질없다. 함민복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작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작품은 함민복의 시집이 아니라 산문집에 실려 있다지만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리. 이 '시'를 맨 처음 읽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몇몇 대목에서는 연구자가 아니라면 알기 힘든 작품의 배경을 덧붙이고 있다. 서른 여덟 나이의 유부남 박목월 시인이 자신을 사랑한 여대생을 따라 제주도로 내려가 생활하던 중 목월 선생의 부인이 내려와 그들 두 사람을 위한 한복과 생활비가 담긴 봉투를 내밀었다는 이야기, 아버지이되 부모가 될 수 없었던 자신의 아버지와 얽힌 김소월 시인의 사무치게 개인적인 한(限)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이다. 이는 단순히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한 흥미 유발이 아니라 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일본인 목도꾼들에게 몰매를 맞아 정신이상자가 된 아비를 둔 김소월의 개인사를 모른 채 그의 작품에 맺혀 있는 한을 “집단적 전통이나 식민지 민중의 심정과 기계적으로 결부”짓는 것은 온전한 이해라고 보기 힘들다. 텍스트(text)만큼이나 그 텍스트가 속해 있는 혹은 비롯된 컨텍스트(context)가 중요하다. 좋은 작품들의 중요한 컨텍스트를 잊지 않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 『시를 잊은 그대에게』의 또 다른 장점이다.
대학 입시 때문에 지금도 억지로 시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든, 시를 향유하는 자리에서 소외된노동하는 청년이든, 심야 라디오에 귀 기울이며 시를 읊곤 하던 한때의 문학소녀든, 시라면 짐짓 모르쇠요 겉으로는 내 나이가 어떠냐 하면서도 속으로는 눈물 훔치는 중년의 어버이든, 아니 시라고는 당최 가까이 해 본 적 없는 그 누구든, 시를 잊은 이 땅의 모든 그대와 함께 나누고파 이렇게 책으로 펴냅니다. 부디 편한 마음으로 즐겨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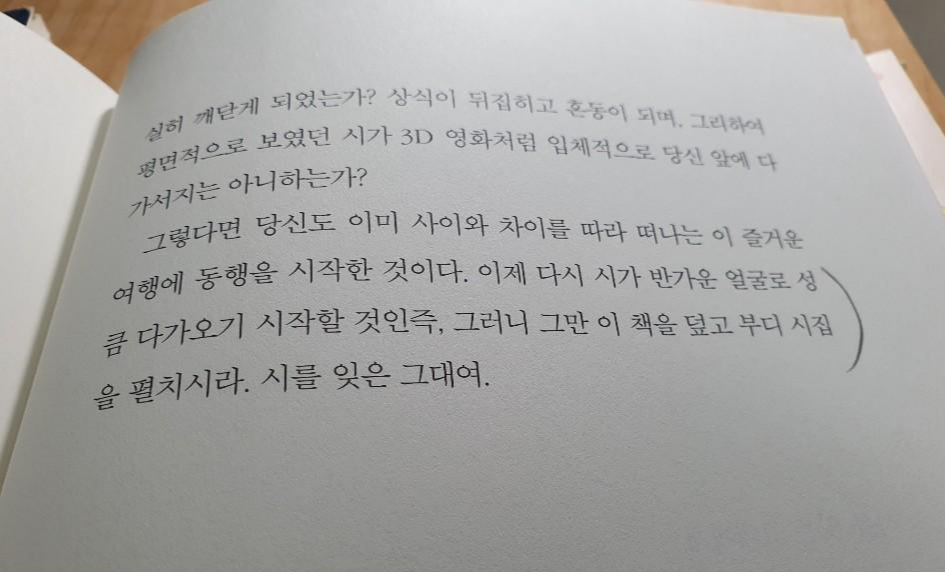
'Library >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와 어울리는 시집 찾기 (3) | 2020.09.07 |
|---|---|
| 『좋아서 하는 일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by 이랑 (6) | 2020.09.01 |
| 『자기만의 침묵』by 엘링 카게 (4) | 2020.06.07 |
| 『노인과 바다』 by 어니스트 헤밍웨이 (7) | 2020.05.24 |
| 『확신의 함정』 by 금태섭 (3) | 2020.04.13 |





댓글 영역